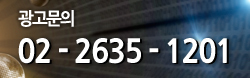- 기사 최종 편집일 2024-04-18 13:29
- 즐겨찾기
플러스
수필ㆍ시
사라져 가는 정겨운 소리들
작성일 : 2020-11-26 10:25
작성자 : 편집부 (ednews2000@hanmail.net)

박 철 한
이 한밤 적막을 깨고 어디선가 두견새가 운다. 이제 막 불을 끄고 자리에 누었을 때다. 멀리서 아스라이 들리는 그 소리가 밤하늘에 은은(隱隱)한데 두 귀를 의심하여 양손까지 귀에 대고 아무리 들어봐도 어릴 때 들어 본 바로 그 소리가 분명하다. 모처럼 가본 고향에서의 잊지 못할 첫날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두견새소리에 도취되어 뒤척이다가 어느새 맞은 새벽녘이다. 당연히 닭울음소리를 떠올리고 은근히 기다렸으나 날이 밝도록 그 소리는 이내 들리지 않고 어쩌다 개 짖는 소리만이 고요를 깰 뿐이다. 어린시절의 추억이 서린 그 곳에서 두견새소리에의 벅찬 감격과 닭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아쉬움이 교차되어 이래저래 잠 못 이룬 밤이었다.
인간을 일컬어 감정의 동물이라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는 것인데 이따금씩 갈수록 감정이 메말라간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감정의 동물인데 그 감정이 메말라간다면 인간성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 일을 어쩌랴. 인간의 감정에 청각의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간다는 것은 어쩌면 예전에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들을 수 없는 자연의 소리이자 정겨운 우리 고향의 소리들 때문은 아닐까?
고향의 밤 정취를 회상할 때 우선 떠오르는 두견새소리는 때론 제 짝이라도 잃고 부르는 듯 구슬프기도 하고 어쩌다 외로울 때면 다정히 속삭이며 애원하는 듯 정겹기도 하여 우리의 정서와도 잘 어울린다고 한다. 어린 시절에 자주 들을 수 있었던 그 정겨운 소리가 갈수록 사라지는 것 같아 늘 안타까운 마음이다.
우리에게 매일 새벽임을 알리며 우리생활과 밀접하고 친근하였던 닭울음소리도 요즘은 좀처럼 들을 수 없다. 어릴 적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새삼스럽다. 시계가 흔치 않았던 예전에도 낮에는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보고 시간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밤에는 그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바느질을 밤 세워 하시면서도 지금쯤 시간이 얼마나 되었으며 언제쯤 날이 밝아올지 몹시 궁금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닭이 울면 그때서야 시간을 짐작하고 아침을 지을 준비를 하셨다 하며 밤에 아기를 낳을 때면 첫닭이 울기 전에 태어났으니 ‘축(丑)’시니 또는 첫 닭이 울고 태어났으니 ‘인(寅)’시니 하는 식으로 아기가 태어난 시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다.
이른 봄, 어김없이 찾아와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지저귀며 우리에게 봄이 왔음을 알리던 철새가 제비였다. 인간과 벗이 되고 싶었는지 제비는 늘 강남땅과 우리 곁을 오가며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들이 냉대를 하니 우리 곁을 떠났는지, 아니면 강남으로 간 뒤 돌아올 길을 잃었는지 영 볼 수가 없다. 우리의 후손들은 아마 착한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줬다는 제비를 과거에 인간과 한집에서 살았던 실존의 새가 아니라 소설에나 나오는 상상의 새로 착각할지 모른다.
첫여름을 알리는 새는 뻐꾸기다. 자신은 알을 품지 않고 다른 새둥지에 몰래 알을 낳아 대신 키우게 한다 하여 미움을 많이 받는 새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마도 자신의 알을 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품지 못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만약 어미 뻐꾸기가 자신이 낳은 알을 제 마음대로 품지 못하고 남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아야만 하는 신세라면 그 심정이야 오죽할까. 그렇게라도 새끼를 기르려는 모습에 오히려 동정이 간다. 뻐꾸기와 더불어 초여름이 제 철인 뜸부기도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영 찾을 길이 없다. 먹이인 우렁이와 개구리가 줄어들자 함께 자취를 감춘 모양이다. 뜸부기는 모내기를 마치고 들판이 온통 파랗게 물들 무렵이면 논다랑이 한 모퉁이에서 짧고도 힘차게 울어댔었다.
여름날, 울 너머 대나무가 더위에 지쳐 늘어지고 외양간의 누렁이마저 졸음에 겨워 왕방울 눈을 감추는 한 낮에도 매미는 그저 신이 나는 계절이다. 느티나무 그늘에서 부채질이라도 하는 날이면 여기저기서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매미들이 합창을 한다. 머리 위 느티나무에서 품위 있게 노래하는 참매미는 아마 테너일 것이다. 이에 뒤질세라 저만치 도랑너머 숲에서 노래하는 녀석과 건너편의 살구나무에서 울어대는 또 다른 매미는 소프라노 인 듯 그 소리가 제법 높고도 맑다. 매미소리에서 우리는 여름이 깊어가고 있음을 안다.
앞마당 멍석에 빨간 고추가 널려있고 뒤뜰, 감나무의 감이 익을 무렵이면 하늘에는 어김없이 고추잠자리가 춤을 춘다. 어느새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낮의 전령이 고추잠자리라면 밤의 전령은 귀뚜라미다. 그때쯤이면 뜰채를 들고 고추잠자리를 잡는 아이들의 즐거운 함성이 들려오지만 한 치 남짓 되는 귀뚜라미는 어쩌면 그리도 날쌔고 높이 뛰는지 뜰채로도 잡을 수 없었던 어린 날의 기억이다.
엄동설한에 추워서 우는지, 기나긴 밤, 외로움에 짝을 찾느라 우는지 겨울밤에 부엉이가 울어대는 날이면 모든 동물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하고 음산하기까지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도 큰 눈을 뜨고서 어디를 가버렸는지 도무지 들을 수가 없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두견새 울음소리부터 뻐꾸기, 뜸부기, 매미, 귀뚜라미, 부엉이에 이르기까지 어린 날, 우리가 즐겨 불렀던 동요나 뭇 시인들의 시구에 무엇보다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이다. 우리의 정서가 벤 정겨운 그 소리들은 또한 우리에게 늘 포근함을 안겨주는 마음의 고향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 둘씩 사라져 일부는 그저 옛 시절의 추억으로만 떠올릴 수밖에 없다. 번민의 일상을 잠시라도 벗어나 위안할만한 마음의 고향을 잃었으니 어찌 허전하고 쓸쓸하지 않으랴. 어느 동요의 가사처럼 겨울밤에 부엉이 소리를 들으며 화로불이 없다면 요즘 흔한 가스레인지 불에라도 밤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절이 다시 왔으면 한다.